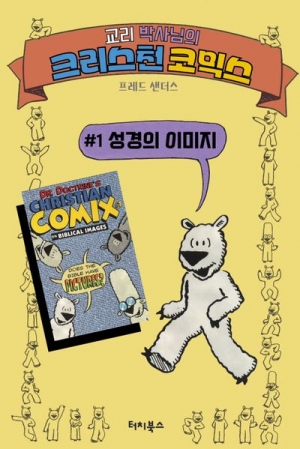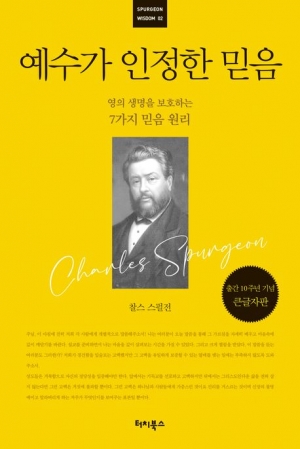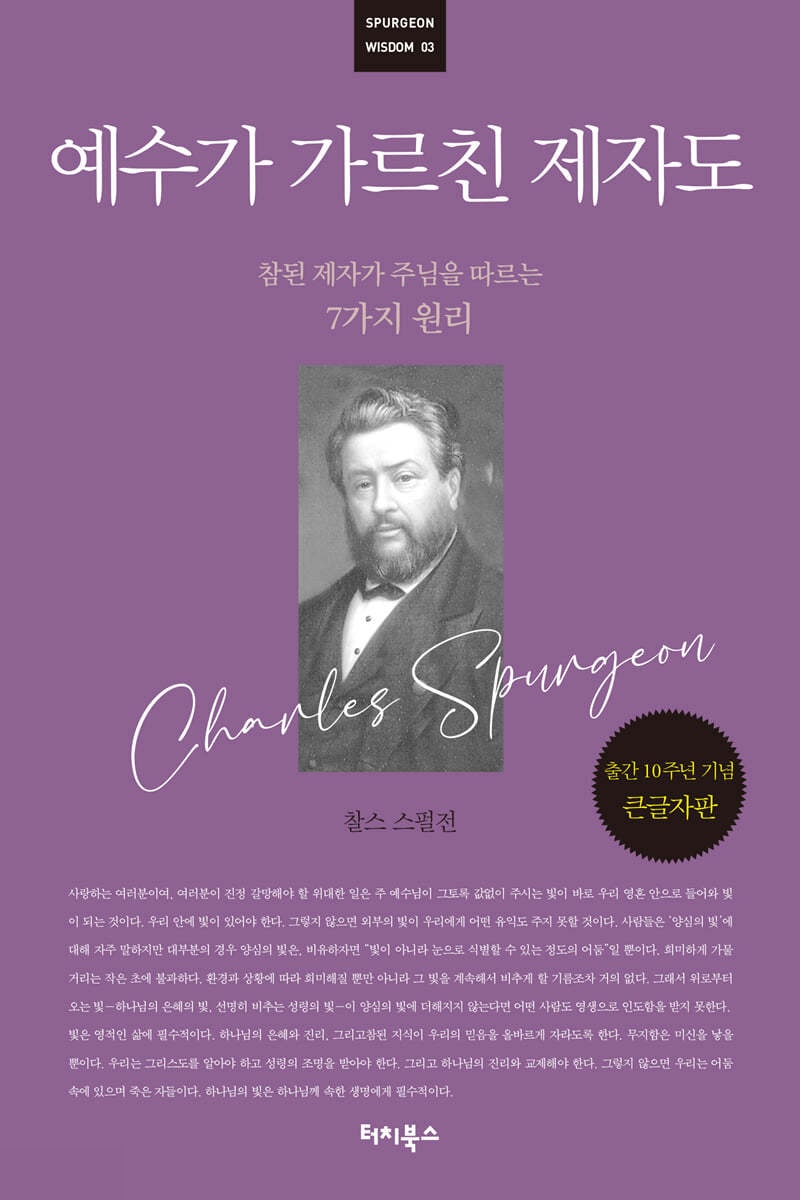서평

현장이 없는 윤리는 윤리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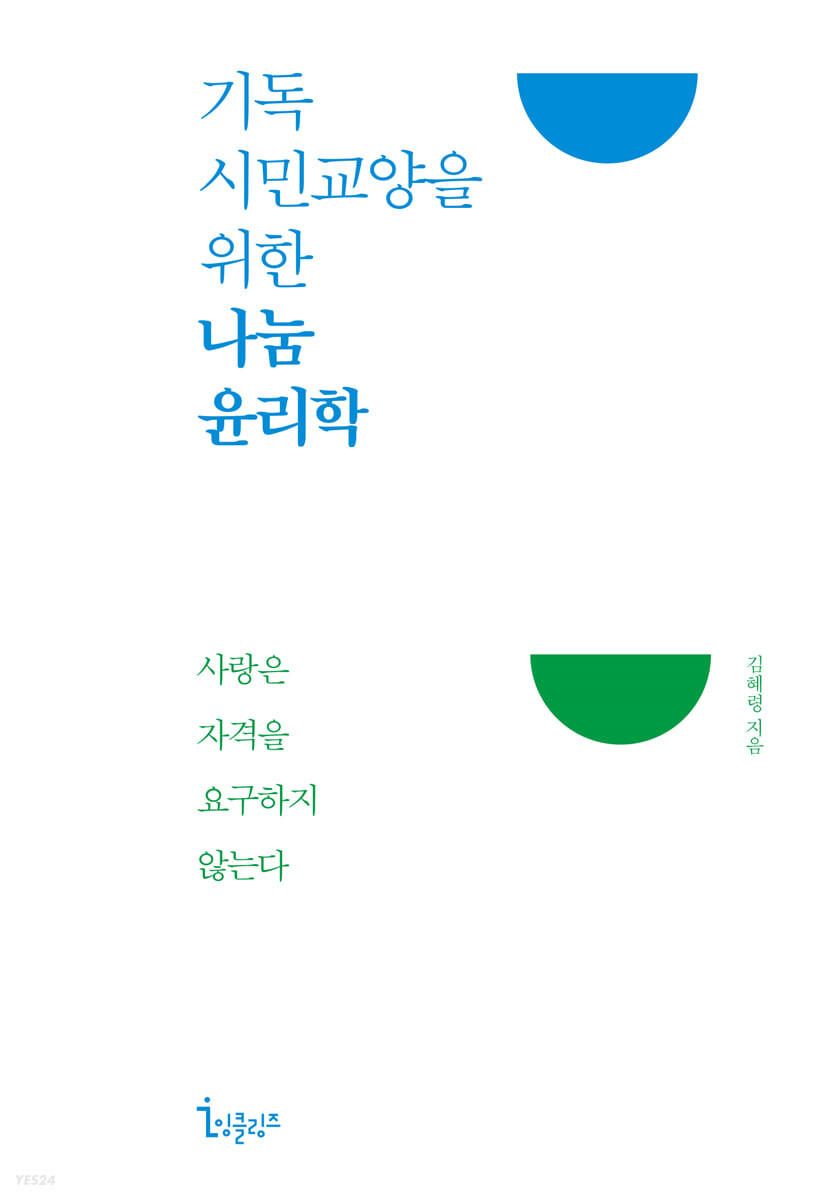 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김혜령/잉클링즈/문양호 편집위원
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김혜령/잉클링즈/문양호 편집위원지난주 10.29 참사가 벌어진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연일 조문을 하고 각종 종교단체가 열고 있는 애도 종교행사에 참여하며 오늘은(11/7) 드디어 미뤄왔던 사과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교집회에서도 사과를 표명하긴 했지만 대국민을 위한 장소이냐라는 장소적 적당성과 그 문구적 표현에 있어 과연 직접적인 사과표현이냐라는 점에서 의문이 가기에 사과라는 말을 배제하고프다. 오늘 한 사과마저도 대국민 성명이 아니라 회의 석상에서 한 것이기에 직접적 사과를 피하고픈 일종의 꼼수같다는 점에서 아직도 한참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과거의 모습보다는 한 걸음 나아진 점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모 라디오에서 기자가 지적했듯 8월의 폭우 때 벌였던 수준미달의 행동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말처럼 그런 사과가 정상이라고, 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나의 말에 발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일련의 사과나 조문 등에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최소한 나에게는 그렇다.
책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이번에 읽은 이 책이 기독인으로서 총체적이고 구조적 난국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며 ‘기독’인, ‘시민교양’, ‘나눔’, ‘윤리학’은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윤리학’이나 ‘교양’이란 타이틀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윤리는 설혹 학문이란 타이틀을 걸어도 그것이 서재나 연구실에 머무른다면 진정성이나 실천성이 결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때 현장에서 유족들의 치유를 위해 힘썼던 정혜신은 그의 책 ‘정혜신의 사람공부’에서 “진료실은 철저하게 의사를 위한 공간이다. ~(중략)~ 극단적이고 역설적으로 말해 진료실은 환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 공간에서 의사는 주인이고 갑이며 환자는 손님이고 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다. 현장성이 없는 윤리와 교양, 학문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잠깐의 현장머뭄과 애도의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의 진정성을 담아낸다고 말할 수 없다. 그 현장의 이해와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감정에 동화됨이 없다면 그 애도와 사과는 진정성이 없고 겉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장을 담은 윤리이고 고통받는 이들의 감정의 동화를 담아내는 책이다. 지금도 교회는 나름의 ‘교양’을 가지고 있고 ‘나눔’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교회라는 울타리안에 머물기 일쑤고 현장에 나아감도 일시적 머뭄으로 그치기에 진정한 이해와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다. 물론 지속적으로 ‘나눔’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감상적인 나눔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 스토트가 그랜드래피즈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구급차를 두는 것도 사고난 사람을 돕는 것이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고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눔은 나눔을 넘어서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바라보고 사회적 고찰이 있을 때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답답해한다. 그속에서 교회는 기도도 해야 하고 나눔도 해야 하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시청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드는 것은 피상적 나눔이나 교양을 넘어 고통의 현장에 더더욱 혼란을 일으키고 상처입은 이들에게 대못을 박는 악한 행위임을 이제는 깨달을 때다.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과 교회에만 머무는 기독인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그분들이 이 책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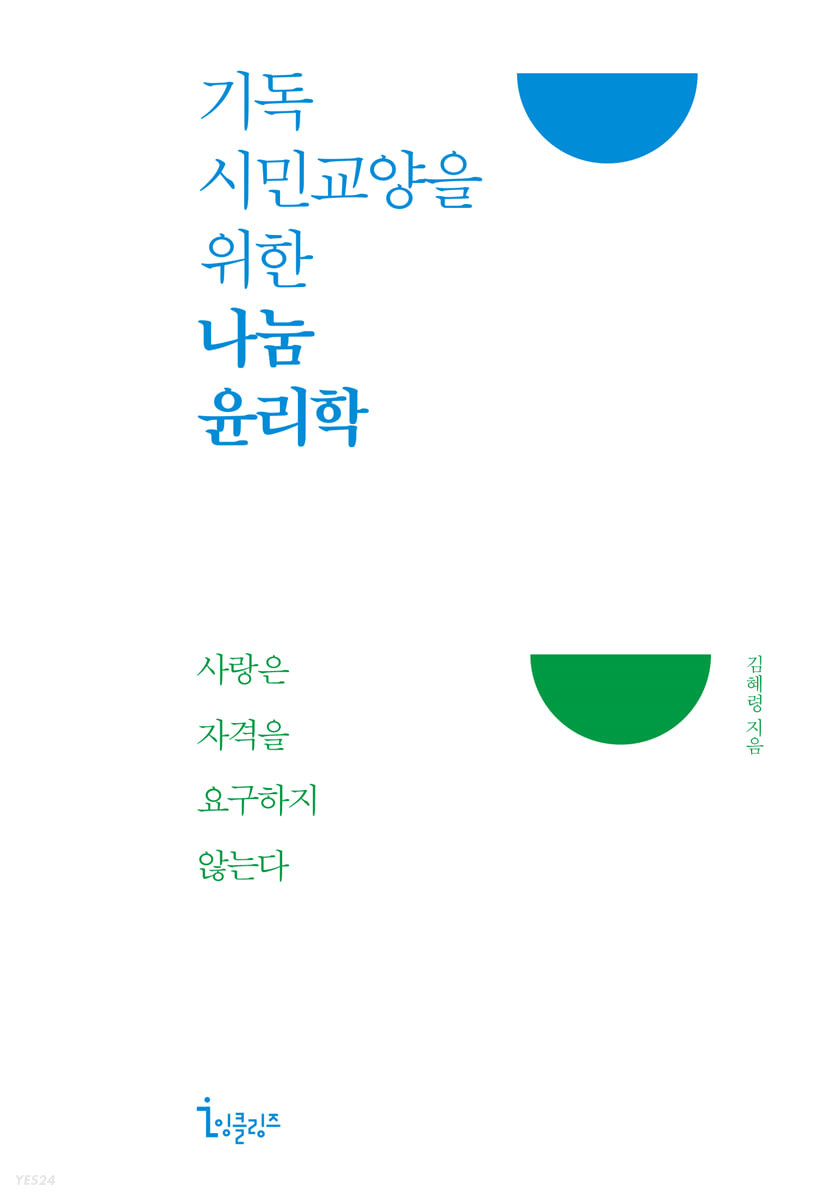












 신고
신고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