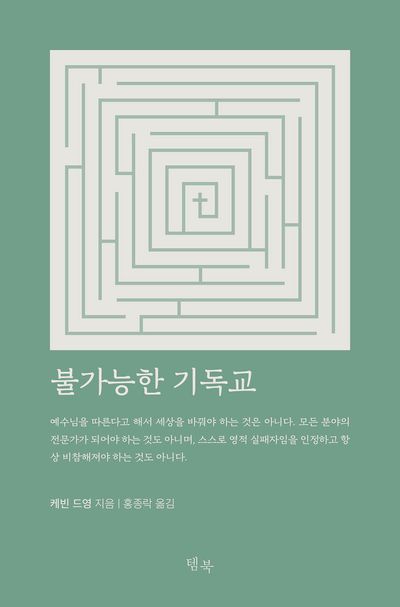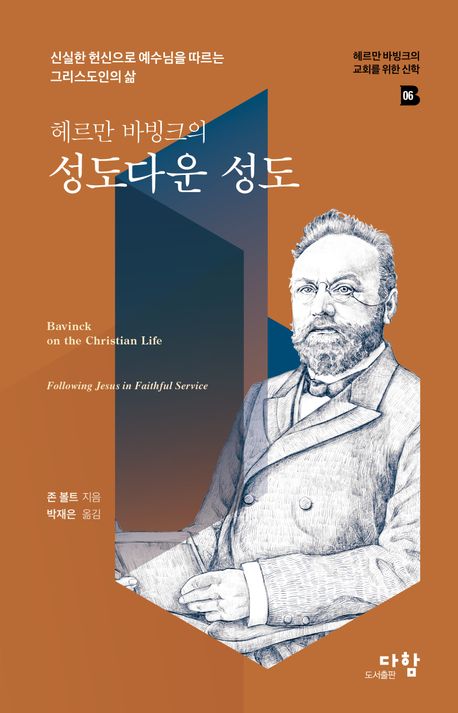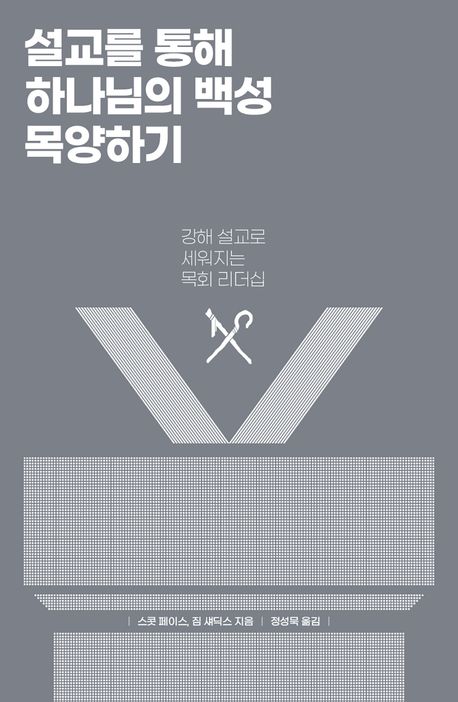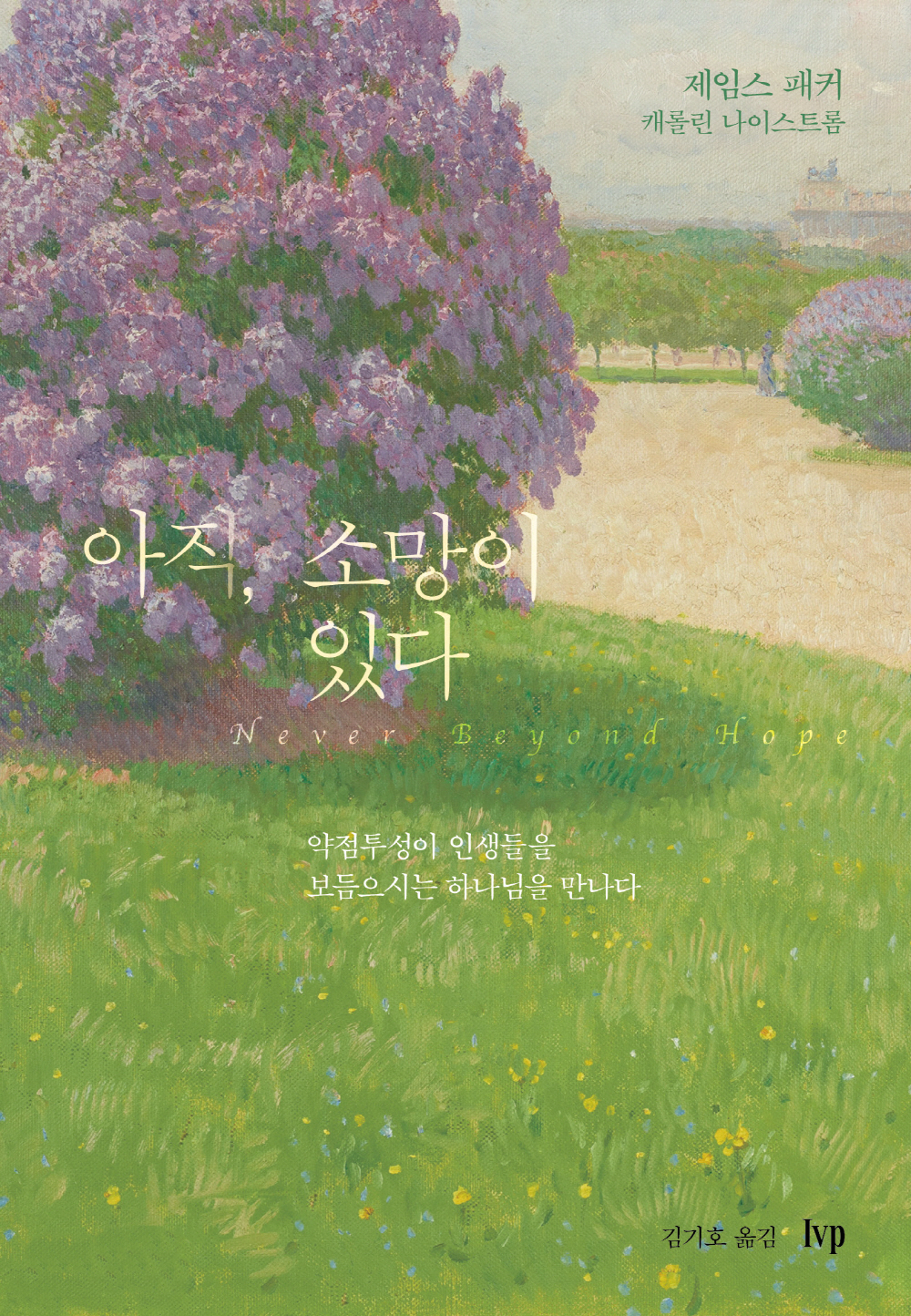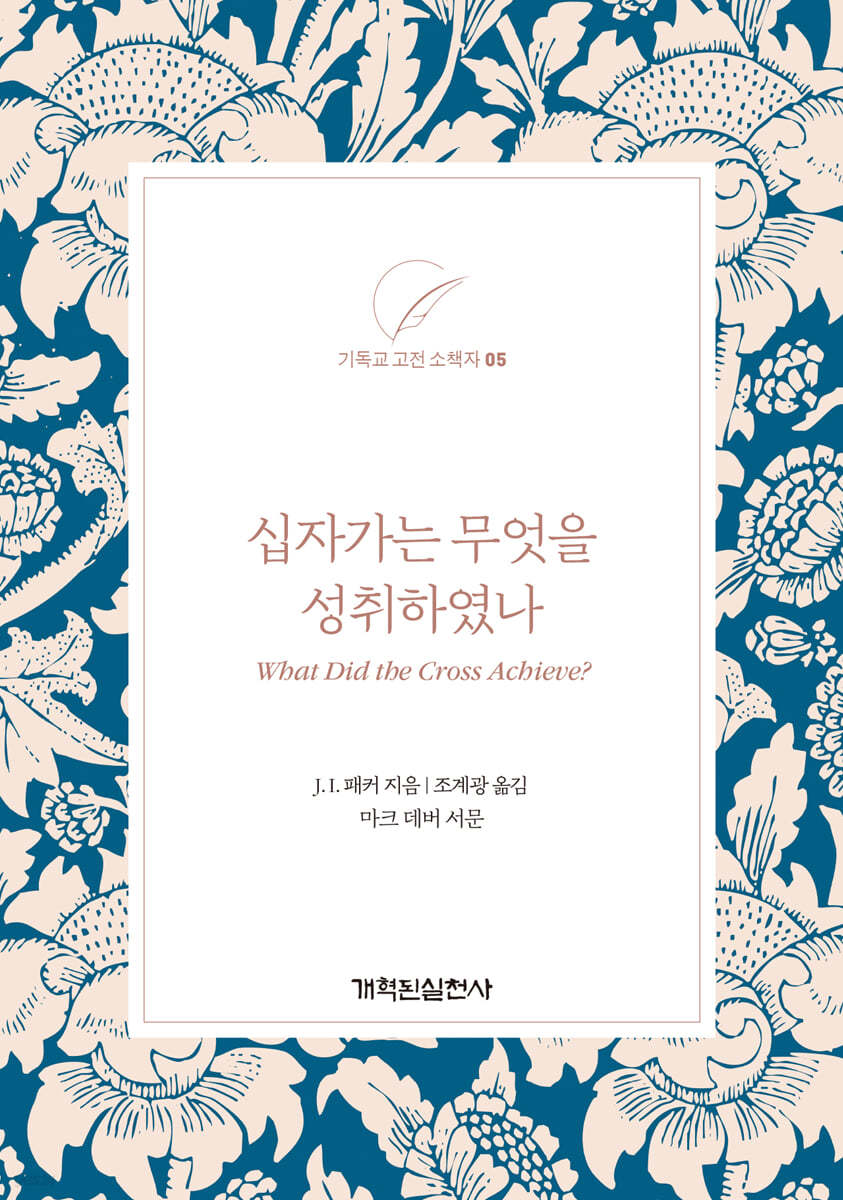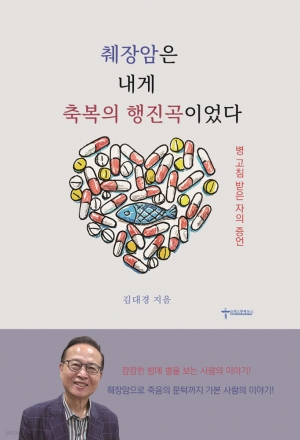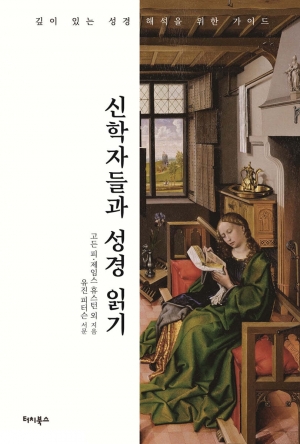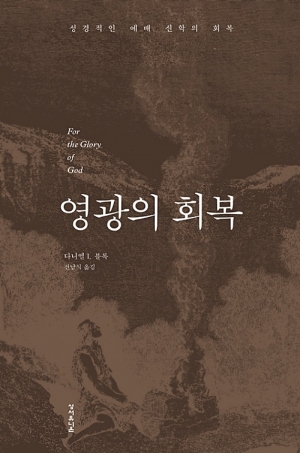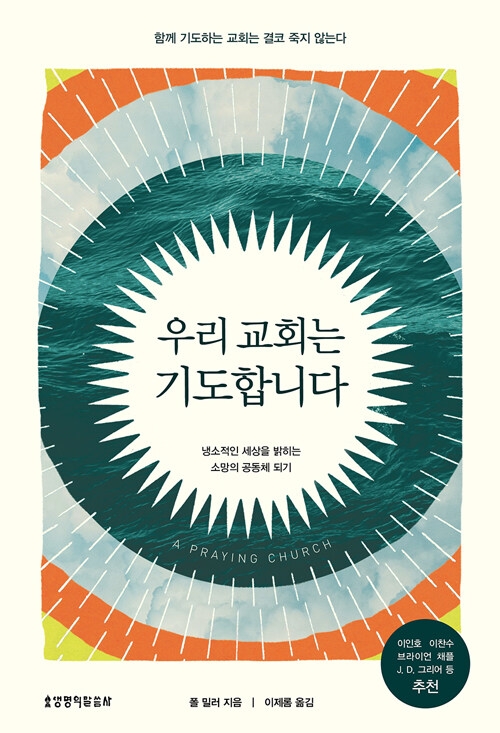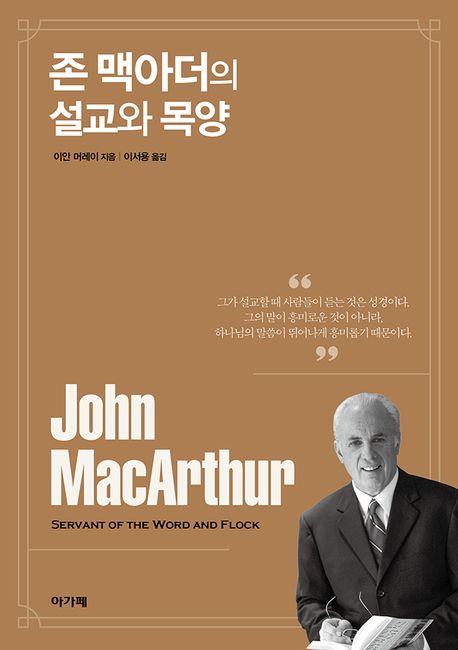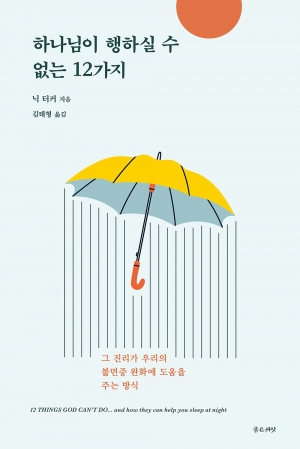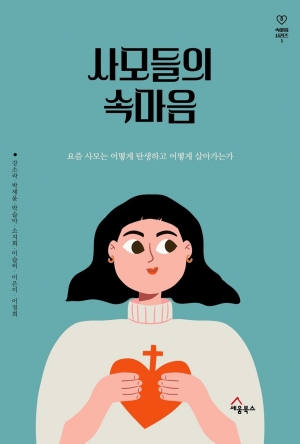서평

상처입은 손을 내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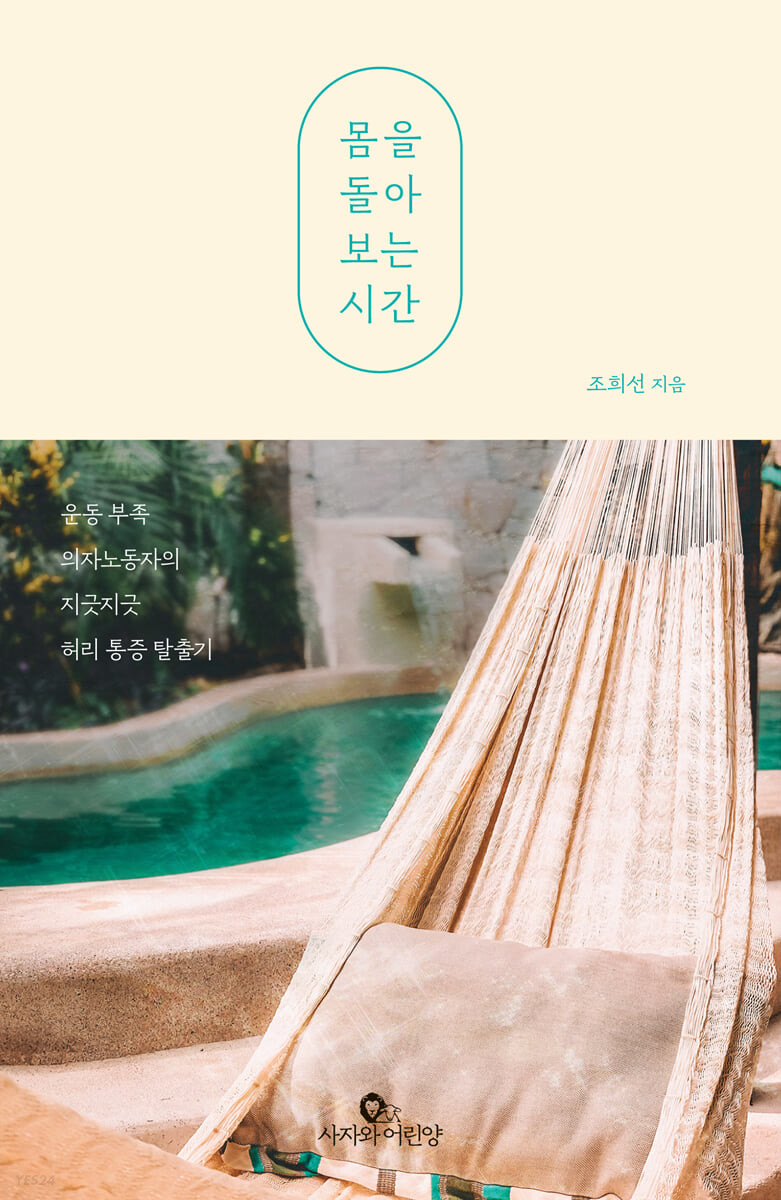 몸을 돌아보는 시간 /조희선/사자와 어린양/문양호 편집위원
몸을 돌아보는 시간 /조희선/사자와 어린양/문양호 편집위원목회라는 길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아프신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런 분들 중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되면 그분의 이해를 위해 자료를 찾고 그에 관계된 책을 여러 권 읽곤 한다. 교회 내에 있던 자폐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해 거의 십여 권 이상을 읽은 기억이 난다. 몇 년째 상담하는 형제의 정신질환을 위해서도 그러했다. 동성애에 관련해서도 그러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자료를 찾아 읽고 해도 그것은 한계를 가진다. 그 병을 앓고 있는 이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이해나 아픔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종종 상담할 때 저의 이해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성도님의 병을 앓은 사람만이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 병을 겪다가 이미 나은 분이라면 그분도 성도님의 현재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지금 겪는 고통만이 실제적 내 고통이기 쉽다. 그런 것 같다. 내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고 심지어 가족이 병을 앓고 있다 해도 그 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번에 읽은 사자와 어린양에서 나온 조희선씨의 ‘몸을 돌아보는 시간’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수십년의 투병기를 담고 있다. 어쩌면 혹자는 그럴지 모르겠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굳이 이런 투병기를 왜 내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그것도 그로 인한 신앙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도 아닌데―결국 우리들은 교회예배나 성경묵상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예배나 성경묵상과 기도시간도 이 세상에 속해서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간과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내가 믿는 신앙은 우리들 삶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구분짓는다. 요셉의 가정문제로 인한 고통과 욥의 시련과 질병으로 인한 아픔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질병과는 다르게 교회나 성도는 여기는 듯하다. 성경의 고통은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의 고통은 목회자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는 깊게 간섭하려 하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모 교회에 다니는 어느 권사님은 전통 있는 꽤 큰 대형교회에 다니시다가 지병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실 수 없었는데 몇 달 전 그분이 소천하실 때 유족들이 출석하셨던 교회에 장례를 부탁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서 내게 그 요청이 와서 대신 장례의 일부를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은 공동체로 여기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무의적 사고를 목회자나 교회공동체는 갖는다. 질병과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결국 천국도성을 향해 가는 길 중에 우리가 만나야 할 문제인데 그 교회의 성경은 이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책을 읽으며 미우라 아야꼬의 투병기가 생각났고 수십 년 전 읽었던 다섯 가지 암과 싸왔던 오혜령의 에세이들이 생각났다. 그분들의 투병 과정들은 지난했고 그 병들은 평생을 이고가는 짐처럼 저자들을 괴롭혔는데 ‘몸을 돌아보는 시간’에서도 그 여정과 고통은 다르지만 작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웠음을 느낀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 그 질병과 장애의 고통은 본인 외에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욥에게 했던 세 절친의 조언은 일상적인 삶에서는 지혜가 될지 모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조언이 또 다른 비수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힘들게 할뿐이다 물론 세친구도 잠시의 기다림과 고통의 현장에서 며칠은 동참했지만 결국 판단과 짜증으로 욥을 공격하곤 만다. 그들에게는 욥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잣대로 욥을 진단하고 처방해버리지만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길이 없는 구석으로 몰아가고 욥을 더욱 수렁으로 밀어 넣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조언은 그런 오지랖과 상처유발자로 나아가 버리곤 한다.
저자는 이 고통 속에서 여러 번 선택이란 상황에 몰리곤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것을 넘어 그 대가와 후유증의 강도가 상당했기에 돌아보면 그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을 불러 일으켰음을 저자는 고백한다. 그런 것 같다. 앞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많은 책을 내 자신 읽기도 했지만 조언 자체는 되도록 자제하곤 했는데 내 자신의 한계와 지식 영역의 부족이기도 했지만 그 선택함에 있어서 그 결과와 열매는 내 몫이 될 수 없고 그 결과가 어떠하건 그 무게와 열매는 오롯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선택을 이야기하는 조언은 쉽지만 정작 그 선택해야 될 책임과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 선택은 쉽지 않다.
저자는 그 선택 속에서 얻어진 시행착오와 지혜를 솔직하게 적어 놓음으로써 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시행착오와 실수를 줄여주려 하는 듯하다. 그래 그런 것 같다. 먼저 숲속에서 길을 가며 헤매던 이들의 흔적과 그들의 발로 이루어진 길을 통해 우리는 산속에서 길을 헤매도 덜 헤매며 안전하게 길을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가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비록 작가와는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을 듯싶다. 저자는 상처난 얼굴, 조금은 지치지만 그 속에서 미소띤 얼굴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채기 많은 몸으로 우리에게 손짓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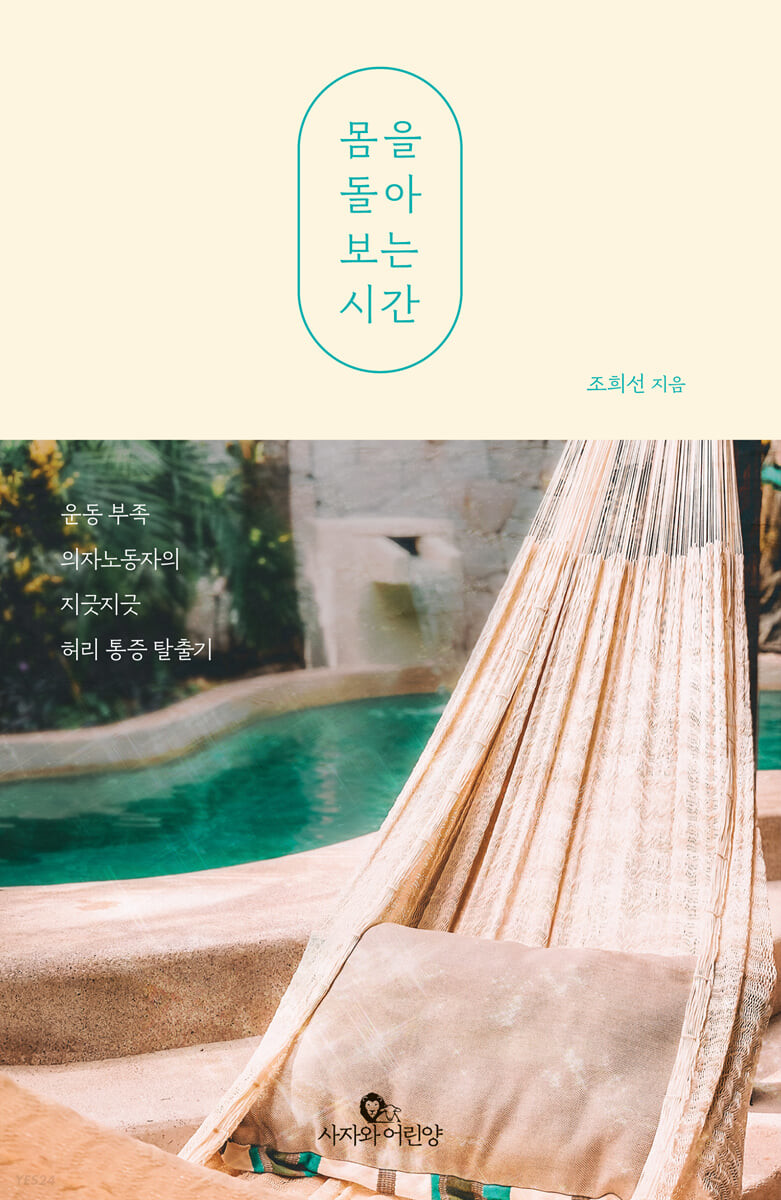












 신고
신고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