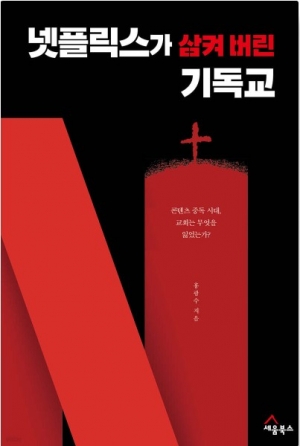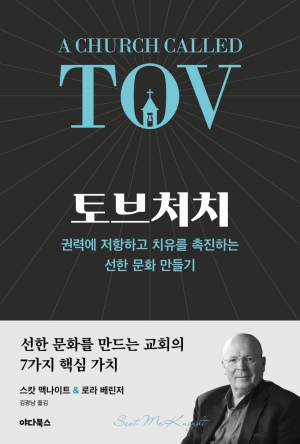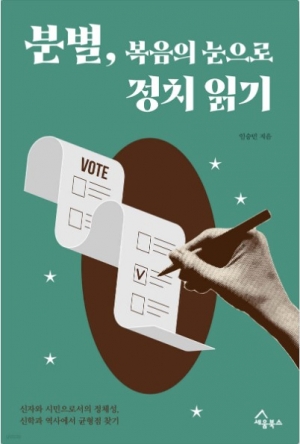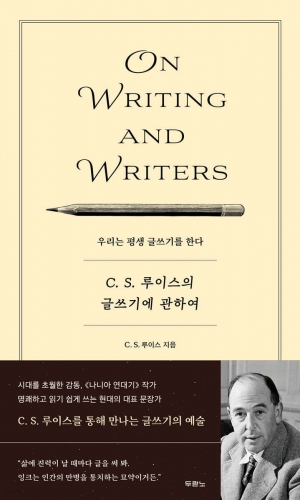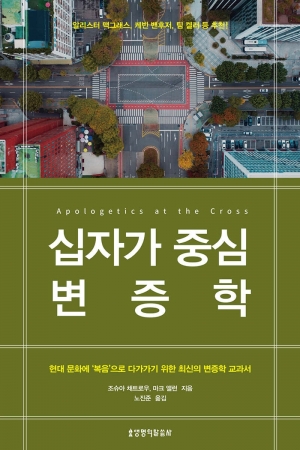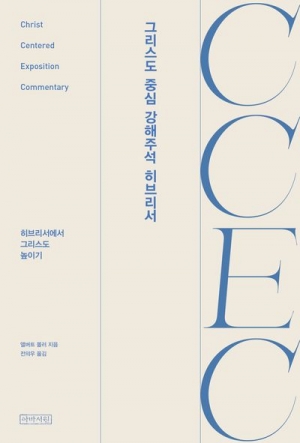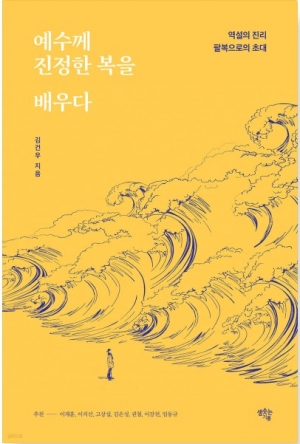서평

시장에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기 위해
 수도회, 길을 묻다-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최종원/비아토르/문양호 편집위원
수도회, 길을 묻다-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최종원/비아토르/문양호 편집위원
교회에 말하는 이들은 많다. 세련되고 현학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많다. 기도회와 찬양도 많다. 단순하게 말하면 시끄럽고 조용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 속에 정작 깊이는 느껴지지 않고 마치 잎은 무성하긴 한데 열매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나무 같아 보일 때가 있다. 차라리 그 정도면 집안잔치이고 집안 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나무가 온갖 해충들로 가득해 나무 주변에 사는 이들을 괴롭히듯 교회가 세상에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 듯싶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과거의 불교처럼 산속에 사찰이 있듯 산속에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머물러야 할까? 아님 세상과 하나 되어 움직이기라도 해야 할까?
이번에 읽은 『수도회 길을 묻다』(최종원, 비아토르)는 그런 고민에 수도회 역사를 통해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수도회는 외형적 이미지로는 세상과는 유리되어진 영성을 쌓는 공동체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수도회의 역사는 세상 속에 속한 공동체이기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속에서 어떤 때는 권력을 부여잡아 세속화 되어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책의 부제처럼 ‘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힘쓰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긴장을 보여준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천국과 제국의 갈등을 풀어가야 할 것이고 삶과의 온전한 유리는 일어날 수 없음을 그 시초부터 보여준다. 이 책의 중반까지는 교회가 국가와의 권력 갈등에서 벌어지는 수도회의 변화와 흐름을 보여준다. 이 책이 수도원이 아니라 수도회라고 표기한 것은 아마도 가시적이고 외형적 실체로서의 수도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제국에 속한 이로서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이들과 공동체의 변모와 갈등의 역사를 담아내기 위함인 듯싶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특히 관심 가졌던 부분은 종교개혁 이후의 수도원의 변모였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떼제와 라브리 공동체부터였다. 그 둘의 비교와 대조는 화해를 추구하지만 밖으로의 운동성은 미비했던 떼제와 나름 명확하게 답은 제시하는 듯 하지만 일방성으로 그치는 답이기에 세상의 수용성은 적을 수밖에 없었던 라브리는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한다.
본 회퍼와 토마스 머튼은 각각 2차대전과 월남전이라는 전쟁 속에서 수도적이면서도 그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를 그들의 치열한 삶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이들이다(우리는 종종 토마스 머튼의 칠층산에서만 머물 때가 많다).
마지막 14장인 『오늘, 수도회를 다시 묻다』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조너선 윌슨 하트그로브처럼 이 시대의 수도회는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아쉽게도 조너선 윌슨 하트그로브의 책은 대부분 절판이다).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은 듯 하고 교회의 영성은 파편화 된 듯싶다. 이런 속에서 이 책은 부제처럼 ‘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의 방식’을 수도회를 통해 길을 물어야 함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신고
신고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